

전시물이 빈약하다


















서울 출신이지만, 이괄의 난때 공주에 기거했다. 아들이 김집. 조선 예학의 태두로 불렸지만 인조반정이후 서인의 정신적 영수이자 당쟁의 주축인 노론의 송시열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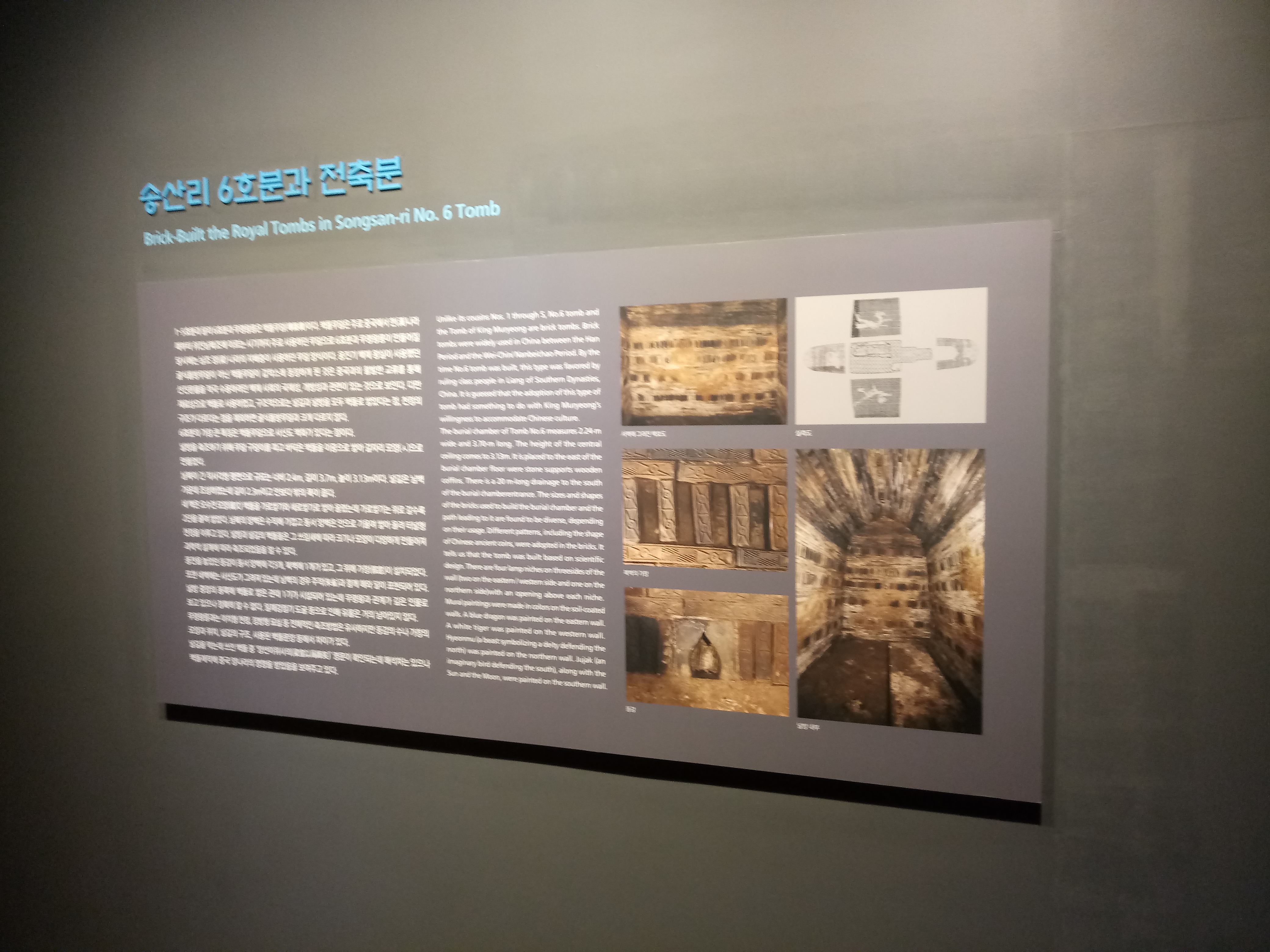
사진유물과 유적의 빈약성으로 무령왕릉이 마치 백제 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



권력자들의 공덕을 찬양하며 억지로 만들어진 옛 송덕비들을 한곳으로 모았다

아신왕은 예성강과 강화도 관미성 전투에서 광개토왕에게 대패하고 위례성까지 유린당하여 광개토왕 앞에서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서약하는 치욕을 겪고 죽음을 면한다.
이후 개로왕이 장수왕에게 아차산에서 패하고 처형을 당한 후 그의 아들 문주왕은 500년 도읍지인 한강 일대를 포기하고 웅진으로 수도를 이전하여 웅진성(현 공주 공산성)을 세웠다.
물론 이 성은 조선때 개수한 것이다






동학농민전쟁 1차 봉기후 정부와 맺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를 일으켜 논산쪽에서 공주방향으로 진격하다가 공주직전의 이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총기에 무참히 패배하여 수많은 목숨을 잃는다.
이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최대 전투였으며 여기서의 패배로 동학농민전쟁은 종말의 계기를 맞았다. 농민군은 해산되면서 일부는 마지막 대둔산전투로 끝을 맺는다.
대학때 지금은 고인이 된 정의당의 노회찬군이 선후배들과 이 곳을 포함해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자고 했는데 그때 왜 나는 못나섰는지 기억이 없고 이제야 처음으로 와본다


<이 산하에> 노래가사처럼 기나긴 압제의 밤을 깨고자 했던 농민군들. 우금치 마루에 흐르던 소리없는 통곡이 훗날 일제로부터의 해방투쟁, 우리 시대 민주화운동으로 발현된 것 같다

'여행과 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한라 생태숲/ 섭지코지 (0) | 2020.06.04 |
|---|---|
| 올레 21길, 지미봉/ 너븐숭이 4.3기념관 (0) | 2020.06.04 |
| 율곡 수목원 (0) | 2020.06.04 |
| 북한산 돌탑정원, 중흥사, 보우국사 비, 거북바위 (0) | 2020.02.09 |
| 1/24. 설 연휴. 인왕산, 안산 (0) | 2020.01.25 |